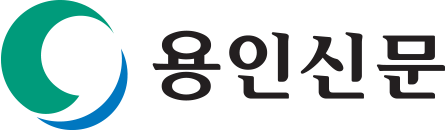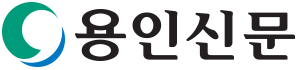용인신문 |

사이버스페이스는 정보 교류의 공간을 너머 인간의 사고와 감정이 데이터로 변환되어 흐르는 거대한 인지의 네트워크이며, 인간의 의식이 기술과 맞닿는 새로운 문화적 생태계다. 이곳에서 인간의 선택, 관심, 관계는 모두 기록되고 계산된다. 그 중심에 자리한 존재가 바로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분석해 효율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계산의 도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인간의 욕망을 설계하고 사고의 방향을 유도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되었다. 검색 결과, SNS 피드, 쇼핑 추천, 심지어 정치적 뉴스까지. 우리는 알고리즘이 짜놓은 질서 속에서 정보를 소비한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선택의 조건이 조정된 상태다.
이 지점에서 ‘알고리즘적 사유(algorithmic thinking)’는 인간적 사고의 자율성을 위협한다. 정보의 편향된 배열은 세계를 해석하는 관점을 제한하고, 반복되는 피드의 구조는 ‘생각의 루프’를 만든다. 우리가 ‘관심 있다’고 느끼는 대상은 사실, 우리가 클릭할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일 뿐이다. 즉,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옳다고 여길지를 점차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미디어 이론가 닐 포스트먼은 “기술은 인간의 세계관을 재편한다”고 말했다. 과거 인쇄술이 근대적 이성을 만들었다면, 오늘날 알고리즘은 ‘계산 가능한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간의 사유는 논리적 판단보다 확률적 예측에 가까워지고, 감정조차 데이터의 패턴으로 분석된다. 유튜브나 틱톡의 자동 추천은 단순한 오락 기능이 아니라, 인식의 지형을 바꾸는 심리적 메커니즘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조차 기술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유로운 사고’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알고리즘은 인간을 통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를 지닌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사고의 다양성을 제거한다는 데 있다. 가장 많은 클릭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계를 단순화시키고, 복잡한 사유를 귀찮은 일로 느끼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보다는 비슷한 생각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 이는 ‘사이버스페이스의 동질화’로, 문화적 다양성의 축소를 초래한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기술을 “드러냄의 방식”이라 정의했다. 즉, 기술은 세계를 어떻게 보게 할지 결정하는 틀이다. 이 말을 빌리면, 알고리즘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존재론적 렌즈’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알고리즘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통해 알고리즘을 다시 강화한다.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세계만을 보게 되고, 보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 무감각해진다. 그것이 바로 ‘알고리즘적 맹목’이다.
그럼에도 알고리즘은 부정적인 존재만은 아니다. 예술과 문학, 게임 등 창조적 영역에서는 그것이 인간 상상력의 확장 도구로 작용한다. AI가 만든 시와 그림, 음악은 인간 창작의 방식을 새롭게 해석하며, 기계와 인간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미학을 제시한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다.
한병철은 “디지털 사회의 위기는 정보의 과잉이 아니라, 사유의 결핍에 있다”고 말했다. 알고리즘의 흐름 속에서 사유하지 않는 인간은 가장 효율적인 존재가 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조종되는 존재가 된다. 따라서 오늘의 사이버스페이스 문화에서 필요한 것은 기술의 숙련이 아니라 ‘사유의 복원’이다.
결국 알고리즘 시대의 진짜 윤리는 기술의 정확성이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 있다. 계산되지 않는 감정, 예측할 수 없는 상상,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 선택. 이것들이 인간다움의 마지막 영역이다. 사이버스페이스 속에서 알고리즘이 인간의 생각을 조종하려 할 때, 우리는 그 흐름을 ‘읽는 능력’을 통해 저항해야 한다. 알고리즘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곧 자신을 지키는 일이며, 인간이 다시 사유의 주체로 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