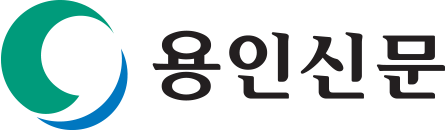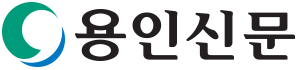용인신문 | 최근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매 시장의 과열 양상이 심각하다. 이는 정책의 허점이 낳은 명백한 부작용이다.
특히 서울 전역과 함께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인 용인시 수지구를 비롯한 경기 남부권 핵심 지역의 아파트 경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현상은, 강력한 규제가 또다시 새로운 투기 통로를 열어주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업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이 100%를 돌파한 데 이어,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 등 규제지역의 10월 평균 낙찰가율은 97.9%로 경기도 전체 평균(87.3%)을 10%포인트 이상 상회했다. 성남 분당구, 하남시 등은 이미 100%를 넘어섰으며, 용인 수지구 또한 이들과 함께 핵심 투자처로 분류되며 낙찰가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열 현상의 근본 원인은 정부 정책의 ‘경매 예외 조항’ 때문이다. 10·15 대책으로 일반 매매는 토지거래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되었다. 그러나 경매로 낙찰받는 주택은 지자체의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2년 실거주 의무도 없다. 주택담보대출만 받지 않으면 낙찰 후 즉시 전세를 놓을 수 있어, 투자자들이 규제를 손쉽게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성남 분당구 아파트가 감정가 대비 117.2%의 고가에 낙찰된 사례는, 규제가 일반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봉쇄하는 동안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투기 세력에게는 ‘규제의 틈새’가 곧 ‘황금 같은 투자 기회’로 둔갑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규제의 풍선효과는 경매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강도 규제로 묶인 수지구 아파트가 관망세를 보이는 사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용인시 기흥구와 처인구 아파트로 투기성 수요가 몰리면서 이들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관찰되고 있다. 규제가 한 곳을 짓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시장의 속성을 정부가 간과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은 실수요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다른 형태로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면, 더 이상 경매 시장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매 주택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 절차 준수나 실거주 의무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면, 경매 주택 낙찰 후 일정 기간 전매 금지와 같은 투기 목적의 단기 차익 실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하고 현실적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규제의 틈새’가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현상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경매 시장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고 완성도 높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