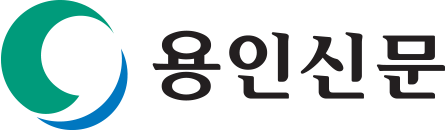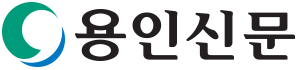용인신문 | 지금 처인성이란 이름으로 벌어지는 문화제 행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처인성의 숭고한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선의의 노력인지, 아니면 명분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주도권 다툼인지. 시민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각 단체가 내세우는 명분 뒤에 가려진 ‘주도권 싸움’ 의 얄팍한 계산을 지켜보는 심정은 착잡함을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정작 가장 중요한 ‘정신’과 ‘내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관계자들 모두에게 묻고 싶다.
처인성의 가치를 논하기에 앞서, 그 역사가 어떻게 시민사회에 뿌리내렸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관의 지원이나 단체들의 관심이 없던 시절, 황무지와 같았던 처인성의 가치를 대중의 품으로 가져오기 위한 묵묵한 노력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1990년대 중후반, 자발적 시민 모임인 ‘처인성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처사모)’을 본지(용인신문)가 주관해 결성했고, 1997년에는 용인신문 박숙현 회장이 쓴 희곡 <처인성>이 『용인문학』지에 발표된 후 비로소 박제된 역사가 아닌 살아 숨 쉬는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했던 것을. 또 이때의 희곡 한 편이 원천 소스가 되어 연극과 뮤지컬이 만들어졌고, 처인성 전투는 용인을 넘어 전국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십수 년 전에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처인성 전투를 다룬 학습 만화책을 발간해 각급 학교에 무료로 보급한 바 있다.
이것이 바로 ‘내실’이다. 하루아침에 전시성으로 만들어지는 성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묵묵히 흙을 고르고 밭을 갈며 일궈낸 인고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처인성 관련 단체들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토대 위에서, 정작 알맹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노력 없이 ‘처인성’이라는 이름만 가져다 쓰려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다. 과거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비해, 그저 자신의 공적비를 세우려는 듯한 시도는 아닌지도 말이다. 이 같은 현실은 시민들의 공감을 결코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처인성 대첩의 정신은 분열이 아닌 통합이며, 독점이 아닌 연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각자의 깃발을 더 높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깃발을 잠시 내려놓고 처인성의 영령들 앞에 마주 서는 일이다. 용인시도 더 이상 갈등의 조정자가 아닌, 방관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행정 편의주의적 모습으로 ‘한 지붕 세 가족’의 기형적 구조를 만든 책임은 온전히 용인시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서,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통합의 장을 열어야 한다.
단순한 행사 통합을 넘어, 처인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꿰뚫는 철학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처인성 대첩은 단순한 지역 전투가 아닌, 고려-몽골 전쟁의 향방을 바꾼 구국의 성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토록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품고도 아직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지 못한 현실 또한 직시해야 한다.
처인성은 어느 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용인시민 모두의 역사이다. 따라서 흩어진 힘으로는 이 중차대한 과업을 이룰 수 없다. 그 역사를 기리는 방식이 지금처럼 분열되고 소모적이어서는 안 된다. 처인성의 영령들이 지금의 용인시를 본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 부끄러움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