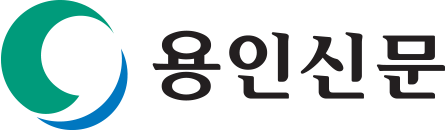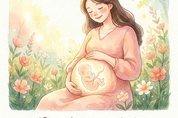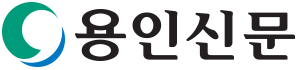용인신문 | 엄마가 들려주는 음악, 읽어주는 동화, 속삭이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는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기 잘 되라고’ 시작한 태교가 오히려 태아와 엄마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과학적 근거와 아기의 입장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음악 태교다.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아기가 똑똑해진다는 속설은 이미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그럼에도 많은 임신부들이 이어폰이나 스마트폰을 배에 붙여놓고 아기에게 직접 소리를 들려준다. 문제는 태아의 귀는 성인의 귀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성숙한 청각은 갑작스러운 고주파나 불규칙한 리듬에 성인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한다. 산모는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선율”이라고 믿지만, 정작 아기에게는 “갑자기 쏟아지는 불쾌한 소음”일 수 있다. 엄마의 선의가 아이 입장에서는 ‘평화로운 콘서트홀’이 아니라 ‘시끄러운 공사장’이 되는 셈이다. 태아에게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뇌 발달에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 다른 함정은 반복이다. 하루 종일 같은 음악을 틀어놓으면 엄마는 아기에게 좋은 자극을 준다고 안심할지 몰라도, 아기에게는 단조로운 소음이 반복되는 감각 피로로 다가올 수 있다. 태아는 외부 자극을 성인보다 훨씬 민감하게 흡수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자극은 뇌 발달 과정에서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잉 자극이 신생아 시기의 주의력 문제와 관련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자극의 양이 아니라 질이며, 적절한 휴식과 안정적인 환경이 태아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사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산모의 마음이다. 태교의 본뜻은 엄마가 차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아기와 교감하는 데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걸 안 하면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죄책감이 태교를 강박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태교는 산모의 소중한 휴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숙제가 되고, 결국 쌓인 스트레스는 호르몬을 타고 태아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아이를 위한 태교가 되레 아이에게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를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태교의 본래 모습은 단순하고 아름답다. 책을 읽고, 편안하게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을 하며 엄마가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아기와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외부 자극의 양이 아니라 질이며, 무엇보다 산모와 태아 모두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이다. 엄마가 행복하면 아기도 행복하다는 진리가 태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
태교는 엄마가 아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다. 그 편지가 다급하고 강박적인 문장과 불안으로 가득하다면 받는 이는 불편하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따뜻하고 여유 있으며 사랑 가득한 문장으로 채워진다면, 그 긍정적인 기억과 정서는 아기의 평생에 걸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아기에게 필요한 건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맹목적인 반복이 아니라, 엄마의 진짜 웃음과 행복한 마음, 그리고 안정적인 교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