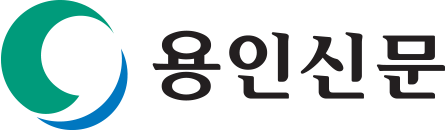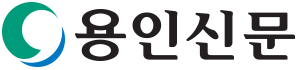애독자 여러분께!
필자는 20대 후반이었던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용인신문 기자로 몸 담아 왔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 우물을 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열악했던 지역신문의 특성상 평생직장 또는 정년을 꿈꾸기엔 절대 쉽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위해 앞장서 왔던 것을 절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환경은 1980년대 후반 언론자유화 바람이 불 때 까지만 해도 최악이었습니다. 5·16 이후 언론계는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때까지 신문·통신사 숫자가 그대로였고, 오히려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행히 1987년 6·10항쟁이후 신문 발행과 편집의 자유가 어느 정도 신장될 수 있었고, 필자가 지역 언론과 인연을 맺은 것도 그때였습니다.
회고해보면 그동안 수많은 지역신문이 생겼다가 사라졌고, 다양한 종사자들이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은커녕 지역신문이 없었던 시절,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은 기껏해야 통제 목적의 제도권 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 커뮤니티는 구술 언어에 의존하는 원시적 방법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의 창간은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위한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순기능에 비해 역기능도 적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필자는 원론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나눔’으로 보고, 지역 언론은 ‘나눔의 미디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의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쉽게 왜곡 될 수도 있는 전통적인 지역사회를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재편시켰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미디어 융합 시대입니다. 또한 개인 블로그와 트윗, UCC 동영상 등으로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언론의 역할과 기능도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독자들도 이젠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DMB 등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본지 역시 홈페이지는 물론 스마트폰과 트윗 등으로 뉴스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뉴미디어 시대를 절감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영측면의 언론환경은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일부 언론재벌 또는 재벌언론을 제외한다면 모두 열악하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수많은 언론사들이 저널리즘의 본질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인신문 역시 언론의 형태가 어떠하든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의 본령은 사회의 공기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필자는 애독자 여러분들로부터 18년 역사의 용인신문 창간이념을 계승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언론환경을 개선하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애독자 여러분!
지루한 폭설과 황사 속에서도 봄은 왔습니다. 필자는 이제 용인신문 발행인을 맡아 ‘나눔의 미디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독자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씨앗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용인신문에 많은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