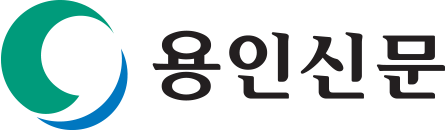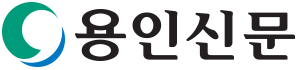·용인신문 | “가뭄은 지도자의 거울이다.” (Drought reveals the quality of leadership.) 물이 귀한 아프리카 케냐의 속담이다. 절묘하다. 올여름 강릉을 덮친 상수원 부족 사태를 미리 예견한 듯하다.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물 천지 즉 바다인 도시, 강릉은 아이러니하게도 단수에 가까운 급수 제한을 겪었다. 음식점은 물론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공공기관 화장실이 폐문됐다. 하필이면 한철 관광으로 먹고사는 도시에 말이다.
상수원이 다르고 백두대간 너머의 일이지만, 이 일이 용인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단정할 수 있을까? 아니다. 만약 비슷한 사태가 수도권에서 벌어진다면 피해는 용인만이 아닐 것이다. 팔당호를 상수원의 80% 이상 의존하는 용인을 비롯, 서울과 인천, 수원·평택·하남·남양주·광주·화성 등 수도권 도시들, 즉 이 나라 인구 절반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물은 단순히 마시고 씻는 생활용수에 그치지 않는다. 용인에 들어설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생각해보자. 반도체는 첨단산업의 상징이지만, ‘물’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산업이다. 웨이퍼 한 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은 약 8000 리터. 클러스터 전체가 가동되면 하루 30만 톤 이상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이는 용인 시민 전체가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과 맞먹는다. 따라서 상수원 공급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산업과 시민 모두에게 동시에 닥칠 것이다.
강릉은 왜 무너졌을까? 이유는 명확하다. 도시의 물이 오봉저수지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뭄이 길어지고 강수가 줄자, 도시는 순식간에 ‘물 고갈’의 현실로 추락했다. 대체 수원(水源)도, 재이용 체계도 없었다. 결국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자 식수는 비상급수 차량에 의존해야 했다. 이 사태는 ‘한 줄기 물에 기대는 도시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이 구조적 취약성은 용인에도 그대로 드리워져 있다. 용인 역시 팔당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 커질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팔당호는 수도권의 젖줄이지만, 결코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다. 여름철이면 녹조가 피고, 광주시를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반복된다. 상류 지역의 비점오염, 생활하수, 축산 폐수, 무분별한 개발 압력이 끊임없이 유입된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강수 패턴이 불안정해지면서, 팔당댐의 저수율이 일정하더라도 실제 유입수의 질과 양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용인이 강릉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물 관리’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상수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고도 정수처리 기술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반도체 산업의 폐수는 고도로 정화되더라도, 미량의 누적 오염이 수질을 뒤흔드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다. 도시와 산업, 환경은 같은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가 시급하다. 첫째, 상수원의 다변화다. 단일 수원에 의존하지 말고 예비·보조 취수원을 확보해야 한다. 청미천 등 지류와 이동저수지, 고초골저수지, 원삼저수지 같은 작은 대체 수원 활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물 재이용률 향상이다. 현재 약 40% 수준에 머무는 재이용률을 끌어올리고, 산업용수 순환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오염원 통합 관리다. 개발 지역의 오염이 상류로 흘러들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물은 기술보다 ‘관리’의 영역이며, 관리란 곧 ‘정책적 결단’의 문제다. 강릉의 식수난은 작은 도시의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메시지는 훨씬 크다. 도시가 성장하고 산업이 확장될수록, ‘보이지 않는 자원’인 물의 중요성은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용인은 지금 국가 전략산업의 심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물이 흔들리면 산업도, 시민의 일상도 동시에 흔들린다. 팔당호는 여전히 수도권의 생명선이지만, 영원히 무한정한 공급처가 아니다. 강릉의 가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내년 용인시장 후보 토론회가 열린다면, 각 후보에게 강릉의 사례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묻고 싶다. 머뭇거리거나 공허한 답을 내놓는 인물이 있다면, 아무리 선호하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맡길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어느 건설사 광고에서 내건 문구가 새삼 떠오른다. “물은 생명이다.” 이제 그 구호는 광고 문안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생존 조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