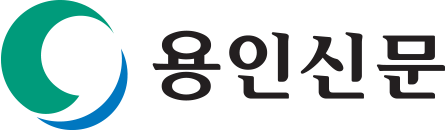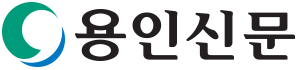용인신문 | “종로 4가에서 만나자.” “종묘 앞에서 만나자.”
같은 장소를 지칭하면서도, 이를 부르는 말 속에는 화자의 무의식적인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종로 4가는 흔히 ‘세운상가’로 통한다. 그 바로 곁에 있는 종묘 안으로 발걸음을 옮겨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여전히 종묘의 위치조차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고, 그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무엇을 상징하는 공간인지에 대한 인식도 희미하다.
종묘는 유교 예제에 따라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제례 시설이다.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과 유교의 조상 숭배 사상이 독특하게 결합한 한국의 사묘(祠廟) 건축 유형이다. 혼령을 위한 공간답게 건물의 배치와 구성, 재료 하나하나에서 절제와 단아함,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엄숙함과 영속성을 느낄 수 있다.
조선 왕조는 이곳에서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 문무백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렸다. 종묘는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신성 불가침의 공간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급박한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종묘의 위패를 가장 먼저 챙겼을 정도다. 종묘는 조선시대의 원형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종묘제례’라는 의례가 이어지고 있다. 유네스코 역시 이러한 건축적 미학과 무형의 제례 전통이 살아 숨 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세계유산으로 지정했다.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세운상가와 고요한 종묘는 서로를 마주 보며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고요하던 종묘가 문화적 가치가 아닌, 엉뚱한 논란으로 뉴스에 오르내렸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사적 유용 논란이다.
관리소 측은 방문 목적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김 여사는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심지어 전날 사전 답사는 물론,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영녕전의 목조 신실을 개방하도록 지시해 머물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드라마가 아니다. 엄연한 현실이다. 비상계엄이라는 공포 영화 같은 악몽을 목도한 국민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일탈을 일삼는 권력에게 이제 양심을 기대하기란 요원해 보인다. 숱한 전란과 수탈 속에서도 지켜낸 세계적 유산이, 세운상가의 고층 빌딩 숲 사이에서 또다시 논란의 볼모가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
물론 재산권도 중요하고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치의 경중(輕重)은 엄격히 따져야 한다. ‘종로 4가’에서 만나자던 친구는 청계천 복원 당시의 반대 여론을 언급하며 결과론적인 개발 논리를 폈다. 반면 ‘종묘’를 약속 장소로 잡았던 친구는 “주민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문화유산은 개발 이익과 동일 선상에 두고 흥정할 수 없는 가치”라고 일갈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대다.
시선을 우리 지역으로 돌려보자. 용인특례시는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거대한 국책 사업으로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획일적인 산업단지 개발 광풍 속에서 문화유산의 가치가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 도시’라는 화려한 구호 뒤편에는 개발 논리에 밀려난 소중한 역사들이 신음하고 있다.
용인의 백년지계(百年之計)는 공장 몇 개를 더 짓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 땅속에 묻힌 매장 문화재와 지역 고유의 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박제된 역사’가 될 뿐이다. 용인시는 지금이라도 문화유산을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이를 반도체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첨단 산업이라는 하드웨어에 문화와 역사라는 소프트웨어가 입혀질 때, 비로소 용인은 삭막한 공업 도시가 아닌 품격 있는 ‘글로벌 반도체 문화 수도’로 완성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은 당장의 숫자로 남지만, 문화적 품격은 영원한 역사로 기록된다. 개발 과정에서 발굴되는 유적을 단순히 공기(工期)를 늦추는 걸림돌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만의 독보적인 스토리텔링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발상의 전환을 기대한다. 그것이 110만 용인 시민이 바라는, 미래를 내다보는 선진 행정의 모습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