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신문 | 필리핀 보홀에 다녀왔다. 보홀은 코로나 이후로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휴양지로,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이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다거북이다. 거북이는 땅 위에서는 느림의 대명사로 통하지만 바닷속에서 본 거북은 날아다니듯 빨랐다. 쫓아 가보려고 해도 너무 빨라서 쫓아갈 수가 없었다. 어찌나 유연하게 헤엄쳐 가는지, 한참을 쳐다봤다. 현지 가이드님들이 저기! 거북이! 하면 나는 보이지 않다가 10초 정도 있으면 보이곤 했다. 어떻게 보는거지? 자신의 길을 아는 듯이 깊은 곳에도, 먼 곳에도 헤엄쳐 가는 거북이를 보면서 나에게 맞는 환경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땅에서는 느릴지언정, 바다에서는 빠른 거북이.

용인신문 | 얼마 전에 마공을 만나서는 늦은 생일편지라며 건네준 편지를 읽고 눈물이 찔끔 났다. 나는 햇살 가득한 선유도 공원에 누워 있었다. 오랜만의 나들이였다. 이제야 여유가 났다. 깔고 앉은 사롱이 점점 촉촉해졌다. 엉덩이도 덩달아 촉촉해져 와서 우리는 옷을 한 겹 더 깔고 앉았다. 나 요새 허리가 아파. 그래서 밖에 오래 있기가 어려워 중간중간 쉼이 필요해. 네 명 이상의 사람 힘들어. 마공이 숨을 쉬는 법을 알려줬다. 호흡하는 그것만으로도 뭔가를 하는 거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용인신문 | 혼자 살면서의 로망은 뭐랄까, 사는 데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지고 싶은 물건을 가져보는 것이었다. 아빠한테는 십몇년동안 이사할 때마다 이고 지고 다니던 LP들이 있었다. 아빠의 학창시절부터 모은 것들이었다. 턴테이블은 예전에 고장나고 없었다. 턴테이블을 갖고 싶었다. 턴테이블을 샀다며 아빠의 LP를 다 가져가려 하자 아빠는 하나씩만 가져가라고 했다. 치사하게 뭐 그렇게 하냐고 생각했지만 주인 맘이지. 그래서 본가에 갈 때마다 아빠의 LP를 하나씩 훔쳐온다. 사실 고백하자면 그리 자주 사용하지는 못한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날이면 몇 달을 켜보지도 못한다. 그런데 싹 청소를 한날, 반짝한 바닥에 누워서 LP를 들을 때면 잘했다고 생각한다. 비오는 날 유재하의 음악을 들을 때도. 무용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용인신문 | 주말에도 평일에도 낮에도 밤에도 몰려오는 부담감과 압박감. 잘 모르는데도 해야하고 물어볼 곳이 없어 막막할때도. 마음 다했던 시간이었던것 같다. 내 실수에 돈이 걸려있는 건 참으로 무서운 일이었다. 다들 어떻게 일하고 사나 싶고. 내가 해야 하는 일임을 알고, 내가 해낼 수 있다면 좋지만 적절한 순간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했다. 맞아. 생각해보면 주변 덕에 해냈으니 나에게도 칭찬을,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께도 충분한 감사를 표하면 될 것 같다. 이제 내가 할 것은 회복하기. 마음을 채우고, 몸을 튼튼하게 하기. 점심 저녁을 해먹고, 아침엔 수영을 가기. 비우기. 배운 것을 복기하기. 사랑하기.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집을 청소하고 돌보기. 감사를 전하기.

용인신문 | 3년 전에 찍은 필름을 현상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을 발견한 기분이다. 제주에 한달살이를 갔던 때다. 부푼 꿈을 안고 간 것과 달리 중산간 마을 생활은 심심하기만 했다. 차도 없는 우리는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일어나서 운동하고, 밥 차려 먹고 나면 하루가 다 갔다. 심심하다 못해 무료해지는 날이면 마을을 산책하러 나갔다. 챙겨간 그림 도구는 거의 쓰지도 못했으며 가져간 사진기에도 고작 몇 장의 사진을 찍었을 뿐이었다. 너무 심심한 나머지 나는 제주에서 운전면허를 따기로 했다. 한 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서 운전 연습을 하고 오면 저녁이었다. 처음 운전은 무섭고 어려워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주행시험 날은 앞사람이 길을 잘못 든 바람에 바로 탈락하는 것을 보고 긴장이 두 배. 제주 한달살이를 끝낸 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찍힌 면허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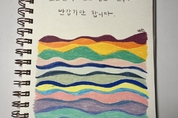
용인신문 |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한 적 있다. 매일 얼굴 보던 사람들을 볼 수 없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지나서 일 년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어려워졌을 때 사람을 사귄다는 건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보다 그 좋았던 시간들을 그리워하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겠다고. 그리워하는 게 우정이고 애정일 수 있겠다고 이제는 같은 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건 정말 찰나일 뿐이고 다시 헤어져서 각자 살다가 만나서 서로 이만큼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이런 일이 있었고 어땠고 이런 생각을 했고…, 요새는 또 이렇고 말들을 나누는 시간이 더 길 거란 걸 알아.

용인신문 | 봄이 되면 생각나는 시집이 하나 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선물해주셨던 시집이다. 이문재 시인의 <지금 여기가 맨 앞>. 10년 만에 나온 시인의 시집은 잘 농축되어 있었다. 그 시들을 읽고 봄을 더 자주 관찰하게 되었다. 연초록빛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부터, 산수유에 새순이 올라오는 것, 노란 꽃을 피우는 것, 말간 연두색 빛들이 조금씩 연초록으로 변하는 것까지 본다. 새로 난 잎은 반짝이고 연하다. 조금 말려있다. 다음날 가서 다시 보면, 말려있던 잎이 펴져 있다. 반짝임은 조금 가셨지만 여전히 다른 잎들과 비교해서는 더 연한 초록색이다. 초록의 변화를 보다 보면 어느새 여름이 온다!

용인신문 | 혼자 살게 되며 가장 즐거운 것은 내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조용한 집안이라는 것. 자극에 약한 나는 작은 소리에도 쉽게 집중이 깨지고는 했다. 깨끗한 책상과 고요함이 날 건강하게 한다. 주의는 기울이되 반응은 없이. 말없는 소리, 내용없는 감정. 소음없는 신호 외부의 소음을 끊고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흔들린다. 어느날, 불안하다고 말하자 선생님은 단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절되면 고립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모든 순간에 연결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라고 하셨다. 온라인에서 벗어나 오프라인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나는 새벽을 잘 이용한다. 사람들이 잠들고 나면 고요한 시간이 오기 때문이다. 핸드폰을 꺼두고 30분쯤 지나면 나만의 시간이 온다.

용인신문 | 요즘은 낮잠을 잘 일이 거의 없다. 그래도 가끔 낮잠을 자고 싶어지는 순간이 온다. 주말 오후 3~4시쯤 빛이 길게 집에 들어오는 때엔 나른해지면서 어렸을 때가 생각난다. 신나게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한숨 자면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를 깨웠다.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을 들으며 일어났었다. 낮에 꾸는 꿈은 밤의 꿈보다 더 허무맹랑하고 달달하다. 그런 꿈을 꾼지가 언제인지! 다음 주말에는 오랜만에 낮잠을 자야겠다.

용인신문 | 어떤 일을해도 힘을 빼는 것이 최종 숙제가 아닐까. 잘해내고 싶은 일 앞에서 긴장되고 힘도 잔뜩 들어간 내 모습을 본다. 힘은 뺄수록 좋다. 대충한다는 말이 아니다. 의외로 힘빼는 게 더 어렵다. 수영을 오랜만에 하러 가면 온몸에 힘을 준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앞으로 밀어내는데 쓰여야 할 에너지가 낭비되기 때문이다. 두어바퀴 돌고나서 몸이 지치면 그때야 비로소 꼭 필요한 때에만 힘을 주게 된다. 행동 사이사이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힘을 줄때와 놓을때를 알고 흐름을 만들어 가야한다. 어깨에 잔뜩 들어간 긴장을 몸을 털어 떨어낸다. 찰랑찰랑 물이 흔들린다.

용인신문 | 친구가 자꾸 죽는다. 그만 잃고 싶다. 지금껏 몇몇 장례식장에는 가지 못했고 갈까말까 저울질하기도 했다. 그리곤 곧 후회했다. 되돌릴 수는 없었다. 후회보단 방문이 낫다. 그리고 방문보다 중요한건 기억이다. 처음엔 죽은 이를 위해 방문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장례식장은 산 자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소중한 이를 보낸 친구가 걱정되어서 방문하고, 소중한 친구를 잃은 내가 걱정되어서 방문하는거라고. 첫 이별엔 얼떨떨했고 각자 아파했다. 두번째 이별엔 더 많이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번째 이별엔 찾아가지 않았고 후회했다. 네번째 이별에는 찾아가 울었다. 이번엔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다. 만나면, 죽은 친구에 대한 기억을 나눌것이다.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하며 살려고 한다.

용인신문 | 새로운걸 배우면 어서 잘하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지고는 한다. 급해진 마음을 느리게 바꾸는데에 힘을 쓴다. 하다보면 언젠가 잘하게 되겠지. 시간을 꼼꼼히 들여야지. 하나를 알았으니 이제 연습을 오래오래 해야지. 그러다보면 어느새 익숙하게 해내는 날이 올거라고. 마음 급하게 하다보면 이상과 현실의 간극에 실망해서 금방 그만두고 만다. 이쯤 했으면, 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 포기한다. 자주 그래왔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처음 해봐서 깨닫는 순간들을 즐긴다. 시간을 들여서 반복하면 어느순간 다음으로 가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