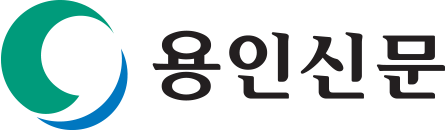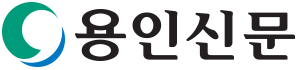다뉴세문경 및 비파형동검, 세형동검 등 재현
 |
||
| ▲ 국보 141호 '다뉴세 문경'의 정밀한 무늬 | ||
이날 시연회에서는 활석 거푸집을 이용한 다뉴세문경 및 비파형동검, 세형동검 등 주물제작 과정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한국전통문화학교 및 일본 동경대 교수와 학생들이 참관해 제작 광경을 지켜봤다.
주성장은 쇠를 녹여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원하는 물품을 만드는 주물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한다. 특히 세형동검 활석거푸집은 1965년 모현면 초부리에서 출토된 유물로 용인시의 역사와 전통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동경대측에서는 이날 다뉴세문경 재현에 관심을 보였다.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다뉴세문경 재현 기술을 터득하지 못한 상태.
국보 141호인 다뉴세문경은 기원전 4세기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잔줄무늬의 청동거울로 우리 조상들의 초정밀 솜씨를 보여주는 대표적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
||
| ▲ 다뉴세 문경의 거푸집 제작을 위해 무늬를 활석에 새기고 있는 이완규 장인. | ||
충남지역에서 발견된 다뉴세문경은 중국과 일본에서 출토되는 청동거울과는 달리 매우 섬세하고 정교한 무늬의 세공기법으로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민족만의 독창적인 거울로서 현대 슈퍼컴퓨터로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정밀한 세공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정밀주조기법은 그간 한국의 7대 불가사의로 기록됐고 카이스트도 복원 프로젝트에 도전했다가 실패해 복원 불가능의 미지의 기술로 남겨져 있었다.
 |
||
| ▲ 40cm의 비파형 동검과 나팔형동기를 황죽에 연결해 완성한 모습. | ||
그러나 이완규 장인은 실험을 거듭해 재질이 무른 활석을 이용한 특수기법을 재현해냄으로써 다뉴세문경과 동일한 무늬를 새겨 넣는데 성공했다.
동시에 세심질을 위한 특수한 도구와 거푸집의 마무리 코팅작업을 개발해 냄으로써 세계 최초로 이를 재현하는 데 성공해 지난 2007년 제32회 전승공예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
||
| ▲ 비파형 동검을 주물 제작하는 모습. | ||
그런데 이완규장인과 함께 조선세법을 연구하는 안편노씨가 황죽을 이용한 길이 120cm의검의 형태를 재현해 이날 첫 선을 보였다.
용도 미상의 나팔형 동기는 크로스가드로 활용되는 물건일 것이고, 나 팔형 동기 안쪽의 홈은 비파형동검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이와함께 팔주령이나 다뉴세문경 등이 그간 주술적 도구로 알려져 왔던 것과는 달리 이들은 무기의 종류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물론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 없고 앞으로 연구 진행돼야 할 부분이지만 참관자 중 일부는 그럴수도 있겠다는 흥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