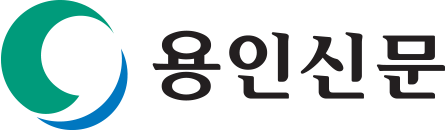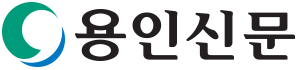용인신문 | 110만 인구가 살아가는 역동적인 용인특례시. 본지는 ‘110만 용인특례시, 그 뿌리를 찾아서’를 통해 용인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왕과 공신이 사랑한 명당의 비밀부터, 수많은 과거 합격자를 배출한 유생의 고장까지, 우리가 몰랐던 용인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편집자 주>
❶ 왕과 공신이 반한 땅, 용인
2. 교육 도시 용인 … 과거 합격율 최다(?)
3. 풍수지리와 '명당' 용인
4. 용인 사람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삼국시대 전략적 요충지·고려땐 교통의 허리
조선 들어선 뒤 권력자들의 식탁 책임지는 땅
한양서 가깝고 비옥·안정적 수취 보물같은 곳
충신들에 토지로 보상… 이상적 식읍지 각인
용인은 조선의 정치지도를 이해하는 키워드다. 땅을 통해 권력이 나눠졌고, 왕이 공신을 품었으며, 중앙과 지방이 연결되었다. 삼국시대엔 전략적 요충지였고, 고려시대엔 교통의 허리였으며, 조선에 들어선 뒤에는 권력자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땅이 되었다. 식읍은 사라졌지만, 그 제도가 남긴 흔적은 여전히 살아 있다. 그리고 그 흔적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다.
지도를 펼쳐놓고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남쪽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지금의 경기도 용인이 나온다. 오늘날엔 민속촌과 에버랜드가 있으며 전원주택과 신도시로 이름난 도시지만, 조선시대의 용인은 전혀 다른 존재감을 가진 땅이었다. 왕족과 공신들이 너도나도 갖고 싶어 하던 식읍(食邑;국가에서 공신에게 내리어, 조세를 개인이 받아 쓰게 하던 고을)의 중심지, 권력자들의 이름 옆에 반드시 따라붙던 땅, 바로 용인이었다.
조선에서 식읍은 충성과 공로의 보상이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공신들에게 왕이 땅을 내려주는 제도였고,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 혜택을 넘어 정치적 지위와 상징의 의미를 가졌다. 그런데 이 식읍이 전국 방방곡곡에 고루 분배된 것이 아니라, 유독 한양 근교에, 특히 용인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흥미롭다. 왜 하필 용인이었을까? 그 땅에 무엇이 있었길래 수많은 공신과 왕족이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새기고자 했던 걸까?
사실 용인이 특별한 땅이 된 건 조선에서만의 일이 아니었다. 삼국시대에도 이 지역은 한강 유역을 둘러싼 치열한 쟁탈전의 무대였다. 초기에 백제의 영토였던 이곳은 고구려와 신라가 한강을 향해 남하·동진하면서 여러 차례 전장을 오갔다. 특히 신라 진흥왕이 한강 상류를 점령하며 용인 일대도 흡수했는데, 이때부터 이 지역은 신라의 내륙 교통망에서 중요한 연결 지점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고려시대에도 용인의 위상은 이어졌다. ‘용구현(龍駒縣)’이라는 이름으로 광주목에 속한 속현이 되었고, 개경에서 충청·경상으로 이어지는 육로망의 핵심 결절점으로 기능했다. 삼국시대엔 전략적 요충지였고, 고려시대엔 중앙과 지방을 잇는 교통로였던 셈이다.
그러한 입지는 조선 들어서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조선은 농업국가였고, 국가는 땅에서 세금을 걷어야 했으며, 공신들도 자신이 받은 식읍에서 일정 수입을 얻어야 했다. 그런데 그 땅이 너무 멀면 문제가 생긴다. 관리를 보내기도 어렵고, 백성들의 반발도 무시하기 어렵고, 위급 상황 시 조정에서 개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한양에서 가까우면서도 비옥하고, 안정적인 수취가 가능한 땅이 이상적인 식읍지가 되었고, 그 조건을 가장 잘 충족한 곳이 바로 용인이었다.
용인은 평야와 구릉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곡식이 잘되고, 물길도 나쁘지 않았다. 또 사방으로 길이 뚫려 있어 한양에서 접근하기도 쉽고, 인근 지역인 광주·여주·수원과도 연계가 가능했다. 한마디로 말해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으면서 세금은 잘 걷히고 관리는 쉬운, 식읍의 황금 입지였다. 게다가 왕실 직할 농장인 궁방전이 곳곳에 있어 왕권이 닿는 범위 안에 있는 ‘안전한 땅’이라는 상징성까지 갖고 있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을 펼쳐보면 이 경향은 분명히 드러난다. 개국 초 이성계는 충신들에게 토지를 나누며 ‘식읍 1000호, 식실봉 300호’라는 식의 보상을 내렸고, 조준·배극렴 같은 주요 공신들은 대부분 한양 인근의 호구를 배정받았다. 용인은 그중에서도 빈번히 등장한 이름이었다. 이 ‘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세금을 내는 세대 단위였고, 곧 실질 수입과 명예의 상징이었다. 공신들은 용인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조세를 받고 이름을 남겼고, 이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정치적 권위의 증명이 되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왕실 소유지와의 관계이다. 용인 일대에는 조선 초기부터 궁방전이 많았다. 궁방전이란 왕실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운영되던 땅인데, 이와 맞물려 인근 땅이 공신들에게 식읍으로 분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왕권이 직접 통제하고 있는 권역 안에서 포상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중앙권력이 변방이 아닌 근거리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전략이기도 했다. 따라서 용인은 왕실의 물리적, 상징적 영향권 안에 있는 ‘왕의 그늘’이자 ‘공신의 울타리’였다.
그렇다고 식읍이 영원히 이어진 것은 아니다. 세조 이후로 조선은 점차 식읍 제도를 폐지하고 전지(토지 할당)나 녹봉(월급) 중심으로 공신 포상 체계를 바꿨다. 정치 체제가 안정을 찾고, 왕권이 더 공고해지면서 땅을 나눠주는 방식 대신, 직책과 급여로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하지만 식읍이 사라진 뒤에도 용인은 여전히 의미 있는 땅이었다. 왕실과 양반 가문들의 기반으로, 그리고 후일 지주와 향촌 권력의 중심지로 살아남았다.
오늘날의 용인을 보면 흥미롭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골프장이 생기고, 서울 사람들이 주말마다 몰려든다. 하지만 그 땅을 밟고 걸어보면, 곳곳에 아직도 오래된 지명과 옛길이 남아 있다. ‘정평리’, ‘백암면’, ‘남사읍’ 같은 이름들은 모두 누군가의 식읍이었고, 왕과 공신이 곡식을 걷던 자리였고, 정치가 흐르던 장소였다. 땅은 기억한다. 권력의 무게를, 세금의 흐름을, 그리고 이름 없는 백성들의 삶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흙 속에 남아 있다. <김종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