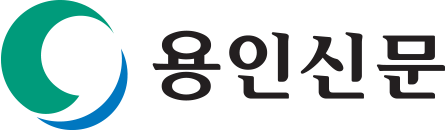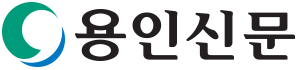이상일 시장(앞줄 우에서 다섯번째)이 처인·기흥 지역 중학교 학부모 대표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은 2024년 용인미디어센터)

이상일 시장이 처인구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은 2024년 시청 비전홀)
‘낙하산 정책’ 학교 현장 따르던 방식 탈피
교육 주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모델
‘생활밀착 현안 해결’ 통해 성공 경험 축적
이상일표 교육정책 제도적인 기반 시험대
용인신문 | 교육 환경은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미래교육 협력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시장이 직접 학부모, 교장단과 매년 정례적으로 만나 현안을 해결하는 이 방식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정책 결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 소통 기반의 실험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110만 용인특례시 교육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이 이를 따르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교직원이 시정에 직접 참여해 교육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 중심에는 2023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미래교육 협력 간담회'가 있다.
# 1단계(2023년): 신뢰 구축 위한 ‘생활밀착형’ 문제 해결
새로운 정책 실험의 성공은 초기 신뢰 확보에 달려있다. 2023년 시작된 간담회는 거대 담론 대신 ‘생활밀착형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 9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총 392건의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용인시는 이 중 340건을 정식 안건으로 접수하고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과 협력해 신속한 처리에 나섰다.
결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났다. 접수된 안건의 45.3%에 달하는 154건이 해당 연도 내에 ‘완료’ 처리됐다. 이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신갈고 CCTV, 수지고 볼라드 설치), 쾌적한 환경 조성(관곡초 인근 공원 정비) 등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다. 이처럼 작지만, 빠른 성공 경험을 축적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소통 채널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 2단계(2024년): 참여 확대와 ‘구조적’ 현안으로의 심화
1차년도의 성공은 2년 차 간담회의 동력을 확보했다. 2024년 간담회에는 전년보다 많은 151개 학교의 학부모회장이 참여했으며, 특히 기흥구 초등학교의 경우 38개교 중 34곳이 참여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신뢰가 쌓이자 건의사항의 성격도 달라졌다.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인 구조적 문제들이 테이블에 오르기 시작했다.
상현초 횡단보도의 고질적인 대기 공간 협소 문제는 학교 부지를 활용해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용인초 부지 내에 안전한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한 단계 진전된 해결책이 모색됐다. 또한, 헌산중 인근 신호등과 덕영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처럼 경찰서와의 협의가 관건인 교통체계 개선 사업들이 ‘올해 완료 예정’ 과제로 구체화 되었다.
이는 간담회가 단순 민원 창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협의체로 기능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년간 누적 851건의 건의사항 중 375건이 완료(완료율 44%)된 성과는 이러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 남겨진 과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화
물론 이 모델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안 중에는 여전히 ‘검토 중(194건)’이거나 예산 및 제도적 한계로 ‘불가(47건)’ 판정을 받은 경우도 상당수다. LED 바닥 신호등이나 캐노피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청소년 시설 건립은 부지확보와 재정 여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운수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버스 증차 문제는 시의 권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광역적 사안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계와 불가 사유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신설 수요 부족, 통학버스 지원 대상 미해당 등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있다.
결론적으로 용인시의 교육 거버넌스 실험은 지난 2년간 ‘신뢰 구축’과 ‘참여 심화’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 성과가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시장의 의지에 좌우되지 않는 제도적 틀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시민 참여를 동력으로 도시의 교육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이상일 용인시장의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