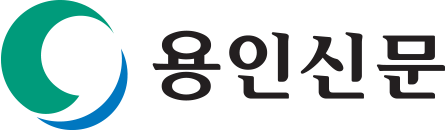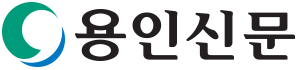용인신문 | 1141명. 일제강점기 사도섬의 광산으로 끌려 온 조선인들이다. 그들의 몸은 사라졌다. 살아있는 몸은 해석되지 않았지만 죽은 몸은 해석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사도 광산으로 끌려왔던 1141명의 죽은 몸은 사회적인 존재다. 오래전 죽은 그들의 몸과 살아있는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관계성이다. 관계는 중간지대가 없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겼다.”라는 것은 소설에나 나오는 소설 같은 이야기일 뿐. 죽은 몸으로 이기려면, 죽은 몸을 기억하는 살아있는 몸들의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모든 경험은 겪은 것의 전부는 아니다. 선택적인 기억의 일부분이다. 경험은 저절로 기억되지도 않는다. 자신의 기억을 인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명확하게 떠오른다. 약자와 약소국에는 자기 경험을 바로 볼 수 있는 렌즈를 주지 않는다. 고통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고통은 대부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픔을 표현하는 것은, 아픈 자의 몫이다. 아픈 자들의 다수는 여전히 약자이다.
2024년 11월 24일. 사도 광산 추도식이 열렸다. 한국 측 유족을 위한 40여 개 좌석은 텅 빈 채였다. 식장에는 희생자라는 표현이 빠진 채 ‘사도 광산 추도식’이라는 글자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인사말로 명명한 추도사는 세계유산 등재라는 성과만 강조됐고 강제노역 사실이나, 희생자에 대한 사죄 표현은 한 차례도 없었다.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한‧일 간 합의로 추진된 행사였지만 일본은 제멋대로 진행했다. 한국은 완전히 무시당한, 굴욕적인 행사였다.
강제노역 피해자를 추모하지 않은 추도식은 일본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단체가 주최했다. 추도식에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주장도 거칠었다.
“일본 정부가 합법적으로 병합한 식민지 자국민을 전시동원령에 따라 소집한 것”이라는 말에 검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누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행사였다.
1141명. 약자. 조선인 노동자들의 경험은 강자, 일본인의 시각에서 해석될 뿐이다. 2024년 11월 25일. 한국 정부는 사도 광산의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터에서 추도 행사를 별도로 진행했다. 고통을 당한 당사자들이 없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고통을 대변하는 주체자에게 공감과 연대의 의지가 없는 정부는 한심하다.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의 합의 불발”로 인해 행사에 불참했다는 한국 정부의 해명은 비굴함이 바글바글한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다. 과거의 역사가, 아니 현실의 역사가 그렇다. 그러므로 아서 프랭크의 ⟪아픈 몸을 살다⟫의 일독(一讀)을 권한다. 고통이 앎의 근원임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즐비하다. “경험은 살아야 하는 것이지 처리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서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승리한다.” “아픈 사람들은 이미 아픔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 문제는 나머지 사람들이 질병이 무엇인지를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책임감이 있느냐다.”
지금 슬퍼진 것은 1141명의 강제노역과 사도광산 추도식 때문만은 아니다. 송두율의⟪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와 베네딕트 앤더슨의 ⟪민족주의 기원과 전파⟫를 읽었기 때문이다.사족, 때아닌 민족적, 애국주의자의 감정이 치밀고 있다.사족 둘, 내 몸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