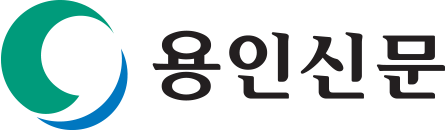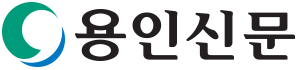용인신문 |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숫자 ‘1’이 시작, ‘2’가 대립을 상징한다고 보았던 반면, ‘3’은 대립을 조화롭게 완성하는 완벽하고 완전한 수로 여겼다. 헤겔의 변증법에서도 ‘3’은 정반합을 통해 새로운 완전함에 이르는 과정을 상징하고, 기독교의 삼위일체나 불교의 삼보, 유교의 천지인 사상 등 종교의 영역에서도 ‘3’이라는 숫자는 조화와 균형의 원리를 설명하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기상학에서 ‘3’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예보관들을 어렵게 하는 숫자이다. 기상청에서는 지난해부터 겨울철 강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순히 ‘눈이 얼마나 쌓일 정도로 온다’는 수준을 넘어 눈의 양과 무게, 건설인지 습설인지 등을 고려한 상세강설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세 가지 과학적 불확실성을 넘어서야 한다.
첫 번째는, 강수현상 자체가 발생할지 그 여부를 예측하는 일이다.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실제로 눈이나 비로 내릴지, 아니면 구름 속에 떠 있을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기의 미세물리과정을 모두 예측해야 한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대기의 안정도가 높고 절대적인 수증기량도 적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두 번째로는 구름 속에서 응결된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가 낙하하여 지상에 떨어질 때까지 빗방울이나 눈의 형태가 유지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기온과 습도의 연직 구조가 조금만 달라져도 눈은 비 또는 진눈깨비로 변하고, 지표면에서 얼어붙어 도로살얼음을 만드는 ‘어는 비’로 바뀌기도 한다. 이에 기상청은 대기 상공의 온도 구조에 따른 물의 상변화와 함께 지표면의 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열역학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두 눈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눈송이 결정의 형태가 가루눈과 같은 건설일지, 성근 가지 모양의 눈일지, 녹으면서 덩어리진 습설일지를 예측해야 한다. 이는 얼마나 많은 눈이 내릴 것인지와 같은 적설량과 더불어, 눈 무게에 의한 구조물 피해, 교통 정체, 물류 지연 등 일상에 영향을 주는 피해의 규모를 가늠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겨울철 눈 예보는 단순한 적설량 예측이 아니라 세 가지의 불확실성을 풀어야 하는, 정교한 과학이론과 관측, 예보관의 경험‧지식이 모두 융합된 결과물이다. 이 세 가지 불확실성은 서로 얽혀 있어, 작은 변수의 변화가 전체 예보를 크게 빗나가게 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그 불확실성을 넘어 눈송이 하나하나의 모양과 크기, 무게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이중편파레이더 기반의 탐지 기술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적극적인 활용과 고해상도 수치모델 운영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과 과학의 불확실성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지구온난화에 따라 호우, 폭설, 태풍 등 극한기상은 점점 더 맹렬해지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 소리 없이 가라앉는 무거운 눈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는 해마다 그 단위를 갈아치우고 있다. 기상청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세강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 노력이 올겨울 국민들이 포근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눈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청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