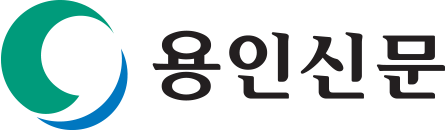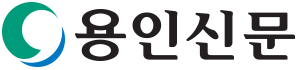용인신문 | 원화 가치 하락이 심각하다. 11월 20일 기준 1달러 1474원, 1500원대가 위협받고 있다.
과거에는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면 수출에 유리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다. 국내 기업 상당수가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 진출한 상태에서 원화 가치 하락은 금융당국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페트로 달러를 적용하는 중동에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대한민국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환(달러) 보유고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한국은행은 환율방어를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이대로 방관하면 IMF 당시의 환율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데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먼저 미국 달러화 강세 및 금리 격차 확대가 첫째 원인이다.
미국 연준(Fed)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완강하게 버티면서 당장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국내외 자본 유출 및 원화 수요의 감소가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 번째 요인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외부 리스크를 들 수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에 편중된 한국의 수출 구조는 환율 변동에 취약한 구조다. 특히 최근 대미 수출이 크게 늘었지만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자동차·반도체 관세가 15%로 확정된 것도 달러 강세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연준과 금리 연동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의 금융정책이 근본적인 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연준 금리와 연동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에 불과하다. 일본은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금리 연동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연준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미국 연준에 종속된 연동금리를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무역에서 달러로 결제하는 페트로 달러에서 하차하는 길밖에 없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인민폐(위안화) 결제만 해도 달러 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물론 미국의 압박이 거셀 것이다. 하지만 길어야 10년이다. 이미 무역의 주도권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