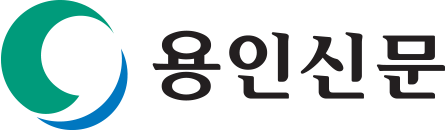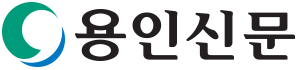용인신문 |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진 시대다. TV나 드라마에서 여성 캐릭터는 점점 더 주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변하는 반면, 남성 캐릭터는 어느 순간 ‘과거의 기세’를 잃고 흔들리는 존재로 비쳐지기도 한다. 집 안에서는 요리하는 남자가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고,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봉투를 들고 내려가는 이들도 대부분 남성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남성성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 역설이 하나 있다. ‘원래 남성이 우위였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긴 역사 흐름을 살펴보면, 조선 건국에서 1990년대초까지 약 600년의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여성의 존재감과 영향력은 결코 약하지 않았다. 왕권 교체, 권력 재편, 지역 세력의 흥망성쇠 속에서 여성은 늘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힘을 행사해왔다.
의학적으로도 생명 탄생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정자는 수정 순간 딱 한 가지, 핵(염색체, DNA)만 제공한다. 하지만 난자는 핵(염색체, DNA) 외에도 세포질(세포의 재료), 미토콘드리아(세포분열 에너지 발전소)가 있다. 그렇다면 핵(염색체, DNA)이 무엇인가? 바로 건축으로 치면 설계도면이다. 도면만 있다고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재료와 연료가 있어야 한다. 생명 역시 핵(염색체, DNA)을 바탕으로 세포의 재료와 연료가 필요하다. 그 모든 기반이 난자에 있다.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는 오로지 난자에게만 있는 것이다.
생물학의 관점에서조차 정자는 생명의 ‘출발 프로젝트’에서 난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다. 난자 없이 정자의 유전자는 단 한 세대도 건너뛸 수 없다.
그래서인가. 인간의 모든 삶에서 남성은 여성의 도움을 받으며 일어나고 활약했다. 역사 속 남성 영웅들을 보아도 그림자는 크게 다르지 않다. 주몽에게는 소서노가 있었고, 왕건의 나라 세우기는 혼인동맹이 완성했다. 태조 이방원 역시 민씨 가문의 후원 없이는 왕자의 난이라는 거대한 승부수를 띄우기 어려웠을 것이다. 남성의 이름만 남았을 뿐, 그 뒤에는 언제나 여성의 결정적 손길이 있었다.
그렇다고 남성이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생명은 결국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만 탄생한다. 난자가 아무리 많아도 정자 하나가 없으면 수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유전적 100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의 핵을 내어놓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열이 아니라 ‘상호 필요성’이다.
문제는 요즘 남성의 심리에 있다. 최근 연상녀·연하남 커플의 증가에는 문화적 흐름도 있지만, 남성들이 ‘가장 역할’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 경제적‧정서적 부담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한다. 사회적 변화 속에서 남성의 기세가 아니라 자신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인물조차 아내 말만 들었다지 않는가.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집집마다 아내의 기세와 지혜가 남성을 뛰어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 우위는 없다. 생명도, 사회도, 가정도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자는 난자를 필요로 하고, 난자도 정자를 기다린다. 역할의 무게가 다를 뿐, 둘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존재다. 오늘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단 하나다. 남성도, 여성도 서로가 있어야 제대로 선다. 서로의 다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