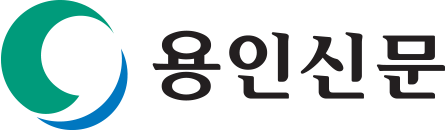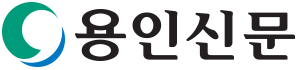용인신문 | ‘식(識)’은 배우고 익혀서 아는 것이고, ‘지(知)’는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아야 할 인간 본연의 앎이다. 그렇기에 무식이 부끄러울 수는 있어도 죄는 아니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무식이 죄가 되는 순간이 있다. 무식이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순간이다. 그것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윤리를 위협한다.
최근 ‘리박스쿨’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역사교육은 단순한 콘텐츠의 선택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특정한 정치적 의도 아래 미래 세대의 정신에 독을 주입하는 반역사적, 반윤리적 행위이다. 이들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며, ‘다양한 관점’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다.“한일합병은 불가피했다”,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는 근대화의 구세주”라는 식의 이분법적 서술은 학문이 아닌 프로파간다에 가깝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 왜곡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에게 구조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단순한 관점의 차이를 넘어 비판적 사고를 무력화시키고, 역사적 감수성을 마비시키는 체계적 세뇌다. 그 결과는 사회 전체의 기억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역사는 기억의 총합이며, 교육은 기억을 되새기고 되묻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기억의 축적이 아니라 망각의 구조화에 가깝다.
어떤 학생은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을 두고 “폭력은 나쁜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다. 심지어 이토를 ‘동양 평화의 사도’로, 안중근을 ‘평화를 해친 테러리스트’로 인식하는 사례도 있다.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가 폭력의 상징이 되고, 조선총독부가 근대화의 주체로 둔갑한다.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왜곡된 역사교육이 자행되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교육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정치인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들은 역사를 기억의 공간이 아니라 권력의 수단으로 여긴다. 그 수단이 겨누는 방향은 언제나 약자를 향하고, 침묵의 그림자에는 대중의 역사적 무식이 철저히 이용된다.
정치는 윤리 위에 서야 하며, 교육은 진실의 바탕을 전제로 해야 한다. 진실을 외면하는 교육은 결코 교육이라 부를 수 없다. 그것은 교육의 이름을 가장한 세뇌이며, 세뇌를 방관하거나 지지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약속을 배신하는 행위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단순한 연도와 사건의 나열이 아니다. 상처를 기억하는 용기, 부끄러움을 직시하는 성찰, 정의를 향한 책임감이야말로 역사의 본질이다. 역사는 과거를 회고하는 기술이 아니라, 현재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사유의 도구다. 역사교육은 단지 ‘앎’을 넘어 ‘사람됨’을 묻는 말이 되어야 하며, 진실에 대한 감각과 윤리의식,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일깨우는 실천이 되어야 한다.
제주 4·3 평화공원, 강제노역 유적지, 5·18 묘역 등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학생들은 역사를 더 이상 ‘교과서 속 타인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는다. 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기억을 말할 줄 아는 시민으로 자라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역사교육의 방향이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우리가 되찾은 것은 단지 국토와 주권이 아니었다. 되찾은 것은 이름이었고 언어였으며 기억이었다. 기억은 기록으로 남고, 교육으로 전해져야 한다. 소멸하지 않을 기억,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를 향한 목소리는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진실 앞에 중립은 없다. 침묵은 방조이며, 왜곡은 곧 폭력이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리박스쿨식 역사 세뇌를 넘어, 진실과 정의의 이름으로 역사를 다시 가르쳐야 한다. 올바른 역사교육이야말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