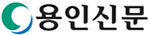우리에게 길은 어떤 의미인가. 걸어가거나 달려가거나 차를 타고가거나 어쨌든 우리는 길 위를 가게 마련이다. 이때 시간은 그림자처럼 붙어 함께 흐른다. 길과 한 몸인 시간. 이때 물리적 길은 후진하거나 되돌아갈 수 있지만 인생의 길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물리적 길이건 생의 길이건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가혹성이 있다.
임후남 시인은 첫 시집 ‘내 몸에 길 하나 생긴 후’(북인 刊)에서 부조리한 세월을 어찌해 볼 도리 없게 진짜 부조리하게 써내려갔다.
삶과 죽음의 ‘사이’, 혹은 ‘죽음’이라는 명제에 대해 그저 덤덤하게 인정하고 있는 임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의 시 ‘무심’처럼 그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심함을 배워야만 한다.
“…//눈을 떠도 온통 까만 그 어둠 속에서/ 죽음의 사자가 손 내밀 때/ 손 들 힘도 없던 그는/ 보일러도 손봐야 하고/ 쓰레기도 치워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는데/ 생각하다 그만 시브럴!/ 조용히 내질렀을 것이다// 곧 아침이 되면 남은 식구들은/ 당신 보험금으로/ 은행 융자를 갚고/ 새 차를 뽑고/ 집을 옮겨갈 것이다/ 봄은 와서 꽃이 피고/ 그래서 그는 어쩌면/ 아이고 소리 한 번 안 내고/ 죽음을 맞이했을지 모른다// 그의 일흔여섯 해가/ 어둠에서 툭. 툭. 툭. 끊어지는 동안/ 구운 고등어를 아들 입에 넣어주면서/ 뜨거운 쌀밥을 한 입 떠먹으면서/ 주말연속극을 보다 눈물을 훔치면서/ 시든 화초를 뽑으면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시. 브. 럴.”(‘시. 브. 럴’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이나, 시든 화초를 뽑아내고 있는 나 역시 시간의 종착역 앞에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시브럴을 중얼거리는 일 뿐이다.
그가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무심히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언젠가 우리 역시 시든 화초처럼 일상의 삶에서 무심히 뽑혀지는 날, 뽑혀지면 그뿐이다.
일상과 죽음은 길 위에 나란히 존재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 조차도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지 못한 채 일상을 챙기고 걱정하고 있다. 죽음 앞에 다달아서야 시브럴을 외친다. 시간은 낱낱의 인생을 알 바 아니다. 평소의 일상대로 흐르는 무심함. 정말 ‘시. 브. 럴’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삶과 죽음의 사이다.
임 시인의 시 ‘사이’에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생과 사의 사이는 얼마나 될까.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날 생의 흔들림.
“구름 사이,/ 바람 사이,/ 나뭇가지 사이,/ 뭉개진 햇빛 사이,// 얼마 남지 않은 오후의 몸/ 이 흔들림이 끝난 후/ 내 무덤에 잠들러 올/ 그리운/ 사이의 것들”
오후가 얼마 남지 않아 곧 흔들림 끝날 것처럼 말하는 시인은 사이의 것들이 그리울 것이라고 말한다.
“굵은 소금 한 줌을 쥐고 보니/ 티가 많다/ 수돗물을 틀어 흐르는 물에 헹궜다/ 굵은 소금 한 줌이 사라졌다/ 소금을 잡아야지,/ 그 사이도 없이/ 마음이 하수구로 떠내려갔다/ 손이 비었다”(‘무심’ 전문)
물에 녹아 없어지는 굵은 소금을 잡을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손이 비어버리는 것처럼 찰라의 순간 사는 우리는 그저 이같은 사실을 무심히 인정해야 한다.
임후남은 20년 넘게 중앙일보와 경향신문 출판국, 웅진 씽크빅에서 일했다. 2011년 계간 시 전문지 '시현실' 신인상을 받았다. 도서출판 '생각을 담는 집' 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