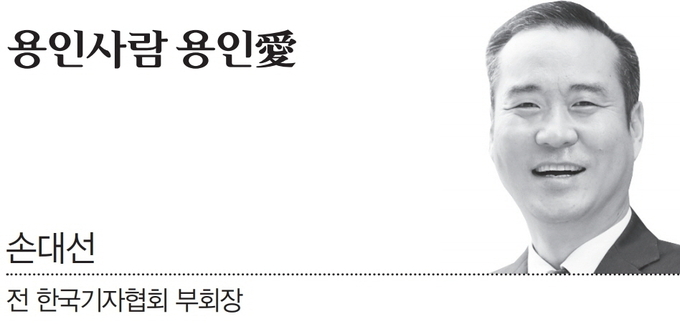
[용인신문] 이사 왔다. 서울에서 용인으로. 14년만의 복귀다. 이곳에 부모와 누나들, 매형과 조카들이 오래 살았다.
대학 시절 용인은 안개가 잦았다. 텁텁한 안개. 술 깬 날보다 깨지 않은 날이 많았다. 용인에 살지만 서울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중심을 향해 달려가고 싶었다. 날마다 상경하고 싶었다.
돌아오지 않은 날들이 잦아지다 서울에 눌러앉았다. 서울은 용인보다 10배 더 사람이 많았다. 10배 더 경쟁해야 했다. 멈춰서면 뒷걸음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번잡한 도시에서, 번잡한 사람이 됐다.
이루지 못할 꿈을 꾸다 깼다.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하던 때였다. 문득, 둘러보니 먼 곳에서 부모는 늙어 있었다. 캄캄한 어둠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방역당국에서는 “찾아뵙지 않는 게 효도”라고 강조했다. 내게는 가능하지 않았다. 그동안 부모에게 기울이지 못한 관심을 벌충하려면 옷깃이라도 붙잡아야 했다. 그래서 이사 왔다.
용인, 안개는 걷혔을까. 이사 온지 일주 일만에 함박눈이 내렸다. 여섯 살 딸아이를 깨워 눈장난을 쳤다. 썰매도 타볼까.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와 관리소장들과 더불어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딸아이와 힘을 보태지 않을 수 없었다. 주말에 이웃들에게 이사 떡을 돌렸다. 한 이웃은 카스텔라로 화답했다. 동봉한 편지지에 적힌 말들이 작고 고와 나는 차마 여기 옮겨 적지 못한다. 승강기에서 마주친 아랫집 할아버지. 딸아이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미안해 고개를 숙이자 “한창 때 애들이 하지마라고 안 하나. 다 그런 거지”라며 허허 웃었다. 서울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다.
이제 해질 무렵이면 딸아이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나란히 신갈천변을 걷는다. 3대가 걷는 길은 용인 시내 깊숙한 곳까지 이어진다. 가다가 지치면 에버라인을 타고 금학천변을 둘러본다. 틈만 나면 중앙시장 순대골목에서 오소리감투와 편육을 산다. 통통하게 살 오른 꼬막을 한바가지 가득 1만원에 살 수 있는 날은 용인5일장이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전화를 돌린다. 수원으로, 안성으로, 화성으로……. 연락의 주도권을 가져온다. 부모와 함께 늙고 싶어 나는 용인에 왔다고. 그들에게 알린다. 마스크 너머 그리운 맨얼굴들과의 만남을 용인에서 예약한다. ‘용인어천가’ 부르냐는 싫지 않은 핀잔을 들어가면서.













